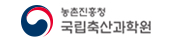[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정부가 계란 껍데기(난각)에 ‘1+’ 등 구체적인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기존 ‘판정’ 표시를 ‘1+‧1‧2등급’으로 변경하는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체 계란 유통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등급란’에 한정된 것이지만, 업계는 이 제도가 도리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맹점은 ‘변하지 않는 등급’과 ‘변하는 품질’의 괴리다. 마블링이 고정된 소고기와 달리, 계란의 신선도(호우유니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산란 직후 1+ 판정을 받으면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져도 껍데기에는 여전히 1+로 남는다”며 “소비자는 등급만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하지만, 실제 품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모순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강조한 ‘자율 참여’가 사실상 ‘강제 의무화’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대형마트 등 구매력을 가진 유통채널의 요구를 농가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당 1원의 등급 판정 수수료는 농가 개당 순수익(약 15원)의 7%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라며 “품질 변별력은 없는데 수수료와 시설비만 늘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등급 판정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샘플) 판정 방식 탓에, 현행 규정상 1+ 등급이라도 파각란(깨진 계란)이나 오란이 최대 7%까지 허용된다.
한 계란 유통업체 대표는 “일반란은 유통 상인이 불량란을 직접 선별해 폐기하지만, 등급란은 오히려 정부가 일정 비율의 불량을 면죄해 주는 꼴”이라며 “운이 나쁘면 웃돈을 주고 깨진 ‘1+등급’ 계란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란계협회 측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등급제 확대를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만들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난각 등급 표시 강행 대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농가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